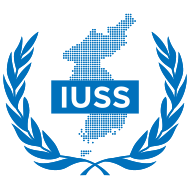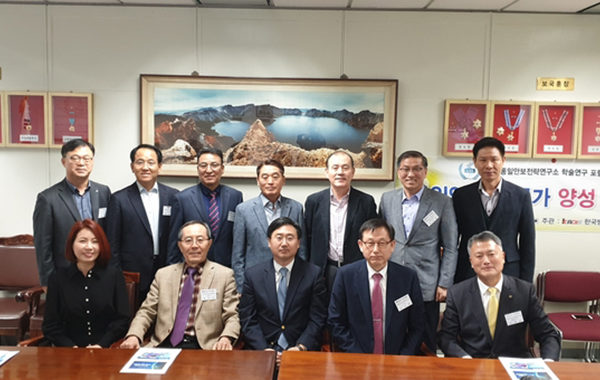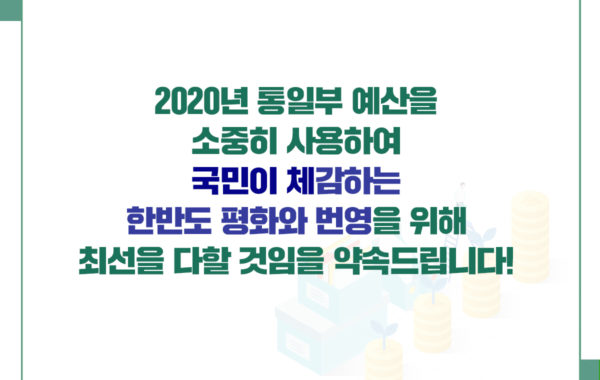21세기의 달은 더 이상 옥토끼의 마을도, 암스트롱이 인류의 첫발을 디뎠다는 50년 전의 그 땅도 아니다. 앞으로 5년 뒤인 2024년 암스트롱의 나라, 미국은 ‘방문’이 아닌 ‘거주’를 위해 다시 달을 찾는다. 텔레토비가 살 것 같은 문 빌리지(Moon Village)의 밑그림이 공개되고, 얼음 형태의 물(H2O)이 있어 ‘생명수’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달의 남극을 향해 우주 열강들이 달려간다. 머잖은 미래에 달은 지구의 남극처럼 세계 각국의 기지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설지 모른다.
지난 21일부터 5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국제우주대회’(IAC 2019)는 그런 우주 신세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행사장 입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SLS로켓 사진과 블루오리진의 달 착륙선 블루문 모형이 양쪽으로 장식돼 있어 분위기를 더했다.
올해 우주탐사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인류가 처음 달을 찾은 지 반세기가 흘렀고, 국제우주대회가 70살, 고희(古稀)를 맞은 해이기도 하다. 행사는 이런 의미에 걸맞게 ‘우주: 과거의 힘, 미래의 약속’(Space: The Power of the Past, the Promise of the Future)이란 타이틀을 내걸었다. 주최 측인 국제우주연맹(IAF)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 브레멘 대회에서는 전 세계 81개국에서 6500명이 모였다. 국제우주대회는 세계 각국의 우주관련 기관·기업이 참가하고 우주 과학기술자들이 교류해 ‘우주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 빌리지(Moon village)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간이 돼야합니다. 달 기지의 식민지화에 반대합니다.” “이제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기술관련 기업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21일 늦은 오후 열린 대회 첫날 마지막 행사에는 ‘진화하는 아폴로: 유인 우주탐사의 다음 50년’이란 제목으로 우주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 록히드마틴의 리사 캘러헌 부사장과 우주 장비업체 나노랙스의 제프리 맨버 최고경영자(CEO), 유럽우주국(ESA)의 얀 뵈르너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이 얘기하는 달과 우주는 상상이 아닌 철저한 현실 속 정책의 공간이었다. 열강이 지구 곳곳을 식민지화하고 파괴한 것처럼 달이나 화성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데 주장에 이견이 없었다. 최근 들어 ‘뉴 스페이스(New Space)’라는 말로 대표되는 민간기업들의 우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지만, ‘달나라 건설’에는 정부,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우주정거장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민간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면에서 각국별 우주청의 역할도 소중하다. 국가간 협업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은 “21세기 우주탐사는 국가간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며 “달이나 화성탐사가 한 국가가 하기에는 버거운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정권에 따라 우주정책이 춤을 춰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우주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대회를 유치한 미국의 입장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21일 개회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글로벌 우주탐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주를 이끌 것이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라면 우주탐사에서의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리더십을 10차례 가까이 반복, 강조해 참석자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019 국제우주대회의 또 다른 모습은 민간기업이 꽃피우고 있는 ‘우주 경제’(Space Economy)다. 전시장 내에는 보잉·록히드마틴·에어버스·아리안스페이스 등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기존 우주 대기업 뿐 아니라, 새로운 우주 서비스와 시장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업들이 전시부스를 열고 있었다.
‘스페이스 플라이트 래버러토리’(SFL) 라는 캐나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는 상업 군집위성을 제작, 발사하는 곳이다.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L3해리스는 우주망원경을 내세웠다. 허블우주망원경·찬드라 X선 망원경·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 일본에 본사를 둔 4년차 스타트업 ‘애스트로스케일’은 우주 청소부를 자처한다. 전자석을 이용해 저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쓰레기를 흡착, 제거하는 위성을 만들어 쏘아올린다.
애스트로스케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아나스 아위다는 “우주 파편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도 제거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수만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우리의 사업 대상”이라고 말했다.
뉴멕시코의 우주공항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는 이처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우주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관이다. 지구상공 100㎞의 준궤도 우주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을 비롯, 7개 우주 관련 기업이 임차인 형태로 우주공항에 입주해있다. 스콧 맥로글린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는 “2006년 개항 이래 지금껏 총 301차례의 발사 서비스를 해왔고, 우주공항 투어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시장 입구 쪽에 대형 부스를 설치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 있는 중대형 인공위성과 한국형발사체 제작에 대한 홍보뿐이 아니다. 소형 인공위성을 제작·수출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민간 중소기업 쎄트렉아이, KAIST 대학 학부생이 창업한 소형로켓 제작업체 페리지항공우주, 위성사진 분석 등의 서비스를 하는 인스페이스 등 10개 기업이 항공우주연구원의 부스 안에 셋방을 차렸다.
페리지항공우주의 신동윤(22) 대표는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을 상대로 개발 중인 추력 2.5t의 소형로켓에 대한 설명을 거침없이 해댔다. 박성동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은 “전시부스는 보잘 것 없지만 전시장 밖 호텔 같은 곳에서 인공위성 제작을 의뢰하려는 외국 고객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며 “누적된 해외 주문물량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미국 스페이스재단이 발행하는 ‘우주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우주산업 매출 규모는 3290억 달러(약 386조원)에 달하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우주산업 관계자는 “우주 탐사와 여기에서 파생돼 급성장한 우주경제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제우주대회에 와보니 세계 주요국들이 안으로는 우주청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밖으로는 각국의 우주청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루마니아나 뉴질랜드처럼 작은 나라도 우주청을 만들어 정책을 통해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주청 설립을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출처) : 최준호, “달은 식민지 아닌 인류의 공간” 우주시대 맞이하는 지구촌, 중앙일보, 2019-10-24 00:00:00